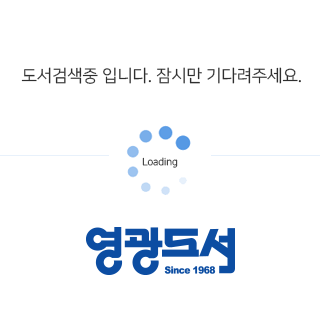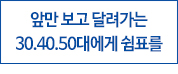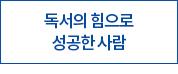▣ 오피니언 칼럼
*제19회 - " 아파트처럼 지내려면 뭐하러 야외에 가나 캠핑은 불편해야 한다 "
영광도서
0
203
2016.12.01 13:06
요즘 캠핑이 시쳇말로 ‘대세’다. 너도나도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텐트를 싣고 시골로 시골로 달려간다. 국내 캠핑 인구 100만 명, 관련 시장 규모는 3000억원을 넘어섰다. 곧 초·중·고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전국 600여 곳의 캠핑장이 텐트로 빼곡히 뒤덮일 게 뻔하다. 일부 캠핑장 업주는 주변 숲을 멋대로 깎아내고 오·폐수 정화시설도 안 갖춰 말썽을 빚고 있다고 한다. <본지 7월 2일자 16면>
캠핑 장비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엔 중심막대 세우고 사방에 펙(peg)을 박아 텐트를 친 뒤 바닥에 돗자리 깔고 배수로를 파면 대충 끝났다. 뜨거워진 해는 그늘막으로 가렸다. 밤에 덜 떨며 자려면 텐트 칠 자리부터 깊이 파야 한다는 것은 군대시절 동계훈련 때 배웠다. 그러나 요즘 유행은 에이(A)형도 돔형도 아니고 거실형 텐트란다. 야외생활의 매력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 있다. 잠자리면 충분하지 거실·테이블·의자까지 갖추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다. 아예 아파트를 통째로 뜯어서 갖고 가든가.
기성세대는 도시에 살아도 고향이 시골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녀들은 다르다. ‘푸세식’ 화장실을 무서워하고 풀섶에서 몸을 흔들거리는 사마귀 한 마리에도 기겁한다. 자연 속에서 겪는 불편함에서 어른들은 향수를 느끼지만 아이들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맛본다.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불편하도록 해줘야 교육효과도 크다. 예를 들어 독일의 아동학자가 제시한 ‘자녀가 일곱 살이라면 배워야 할 것들’, 즉 ‘야외에서 불을 피우고 끌 줄 알아야 한다’ ‘눈사람·모래성과 개울가 둑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야 한다’ ‘나무에 올라가 보고 개울에 빠져봐야 한다’ ‘원하는 걸 모두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등은 아이가 실제로 시도해 봐야 가능하다(요아힘 모르 외, 『무엇이 과연 진정한 지식인가』). 야외에서까지 흙 묻히지 말라, 옷 적시지 말라,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너무 조바심치는 건 볼썽사납다.
도시생활에 젖은 아이들에게 자연이 좋긴 하지만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 먹거리를 구하고 요리하고 먹고 치우고 싸고 잠들고 깨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깃드는지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한다. 깔고 앉을 돌 하나 고르는 데도 요령이 있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 모기에 물리고 따가운 햇볕에 팔과 등의 피부가 벗겨져도 크게 걱정할 것 없다. 한밤중에 쉬야가 마려워 혼자 텐트 밖으로 나섰을 때, 캄캄한 산속의 괴괴한 정적과 수상한 새소리, 뒤이어 밀려드는 무언가 모를 공포감을 통해 당신의 자녀는 아득한 원시시대 조상들과 똑같은 체험을 공유하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큰 공부다. 여하튼 캠핑은 불편해야 맛이다.
중앙일보[2012.07.06. 분수대 - 노재현 논설위원]
캠핑 장비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엔 중심막대 세우고 사방에 펙(peg)을 박아 텐트를 친 뒤 바닥에 돗자리 깔고 배수로를 파면 대충 끝났다. 뜨거워진 해는 그늘막으로 가렸다. 밤에 덜 떨며 자려면 텐트 칠 자리부터 깊이 파야 한다는 것은 군대시절 동계훈련 때 배웠다. 그러나 요즘 유행은 에이(A)형도 돔형도 아니고 거실형 텐트란다. 야외생활의 매력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 있다. 잠자리면 충분하지 거실·테이블·의자까지 갖추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다. 아예 아파트를 통째로 뜯어서 갖고 가든가.
기성세대는 도시에 살아도 고향이 시골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녀들은 다르다. ‘푸세식’ 화장실을 무서워하고 풀섶에서 몸을 흔들거리는 사마귀 한 마리에도 기겁한다. 자연 속에서 겪는 불편함에서 어른들은 향수를 느끼지만 아이들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맛본다.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불편하도록 해줘야 교육효과도 크다. 예를 들어 독일의 아동학자가 제시한 ‘자녀가 일곱 살이라면 배워야 할 것들’, 즉 ‘야외에서 불을 피우고 끌 줄 알아야 한다’ ‘눈사람·모래성과 개울가 둑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야 한다’ ‘나무에 올라가 보고 개울에 빠져봐야 한다’ ‘원하는 걸 모두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등은 아이가 실제로 시도해 봐야 가능하다(요아힘 모르 외, 『무엇이 과연 진정한 지식인가』). 야외에서까지 흙 묻히지 말라, 옷 적시지 말라,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너무 조바심치는 건 볼썽사납다.
도시생활에 젖은 아이들에게 자연이 좋긴 하지만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 먹거리를 구하고 요리하고 먹고 치우고 싸고 잠들고 깨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깃드는지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한다. 깔고 앉을 돌 하나 고르는 데도 요령이 있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 모기에 물리고 따가운 햇볕에 팔과 등의 피부가 벗겨져도 크게 걱정할 것 없다. 한밤중에 쉬야가 마려워 혼자 텐트 밖으로 나섰을 때, 캄캄한 산속의 괴괴한 정적과 수상한 새소리, 뒤이어 밀려드는 무언가 모를 공포감을 통해 당신의 자녀는 아득한 원시시대 조상들과 똑같은 체험을 공유하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큰 공부다. 여하튼 캠핑은 불편해야 맛이다.
중앙일보[2012.07.06. 분수대 - 노재현 논설위원]